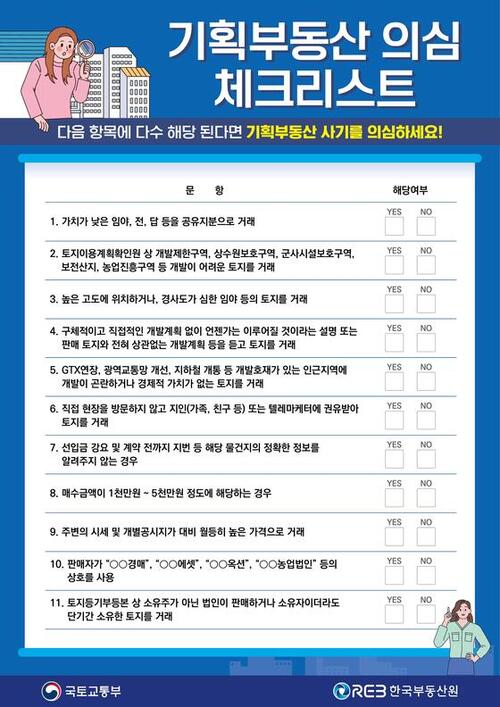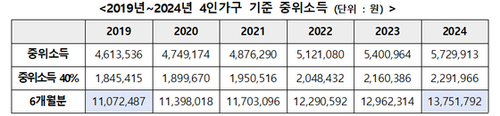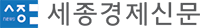지금도 가능한 만5세 조기입학 한해 500명 불과…신입생의 0.1%
1·2월생 '빠른입학' 땐 연 4만명 안팎 '발육부진·부적응' 이유 취학 늦춰
학부모·전문가 "초1 교실서 15개월 차이, 신체적·지적 발달격차 커"
지금도 가능한 만5세 조기입학 한해 500명 불과…신입생의 0.1%1·2월생 '빠른입학' 땐 연 4만명 안팎 '발육부진·부적응' 이유 취학 늦춰
|
 |
초등학교에 1년 일찍 '조기입학'하는 아이들이 한해 5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초등학교 신입생의 0.1% 수준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1∼2월생이 3월생보다 한 해 빨리 입학했는데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면서 연간 4만명가량이 취학을 유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한국식 '세는 나이' 8세)에서 만 5세로 낮추기로 하면서 학부모들은 이런 혼란이 되풀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3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를 보면 2021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 아동은 537명으로 전체 초등학교 입학인원(42만8천405명)의 0.125%에 불과했다.
초·중등교육법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5세에 조기입학하거나 7세로 입학을 늦출 수도 있다.
조기입학은 정부가 취학기준을 '3월생∼이듬해 2월생'에서 '1월∼12월생'으로 바꿨던 2009학년도에 9천707명, 2010학년도에 8천417명으로 비교적 많았다.
'빠른 생일'(1∼2월생)이 한 해 일찍 취학하는 제도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이전처럼 1∼2월생 자녀를 일찍 입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기입학 아동은 2011년 4천89명, 2012년 3천86명, 2014년 1천848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2019년부터는 500∼6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빠른 입학'이 있던 때에는 오히려 취학을 유예하던 아동도 많았으나 제도가 바뀌면서 이런 아동의 수는 급격히 줄었다.
질병·장애·해외출국 등이 아니라 '발육부진'으로 취학을 유예한 아동은 '빠른 입학'이 있던 2006학년도 4만853명, 2007학년도 4만7천711명, 2008학년도 4만7천102명을 기록하는 등 한해 4만명 안팎이었다.
취학기준일이 바뀐 2009학년도에는 발육부진으로 인한 취학유예자가 2천493명으로 급감한 뒤 이듬해 1천131명으로 더 줄었고, 2018년 이후에는 매년 100여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취학기준일을 바꾼 이유로 1∼2월생이 동급과 태어난 해가 달라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던 점을 들었다.
다음 해에 학교에 가려면 취학유예를 신청해야 하는데 진단서가 필요해 절차가 번거로웠고 허위진단서 발급 사례도 많았다.
'빠른 입학'을 꺼리면서 2006년에는 1월생의 41.6%, 2월생의 58.6%가 취학을 유예하기도 했다.
이처럼 '빠른 입학'이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폐지됐지만, 정부가 계획대로 학제개편을 하면 10여년 만에 다시 나이가 다른 아이들이 4년간 함께 입학하게 된다.
학부모들과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발달격차에 따른 교실 혼란을 우려하며 정부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9년생, 2020년생 딸 둘을 둔 이모(43)씨는 "아이들은 불과 몇 달 먼저 태어났는지에 따라 발달단계가 크게 다르다. 어린이집에서는 1월생이 12월생보다 키가 10cm는 커보인다"며 "거의 15개월 차이 나는 아이들이 한 교실에 모여 있으면 당연히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도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적으로 관심이 없는 부모가 아이를 (발달단계와 상관없이) 그냥 (만 5세에) 취학시키고 교사도 학생 수가 많아 아이들의 발달격차를 커버하기 어렵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가 15∼18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연착륙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