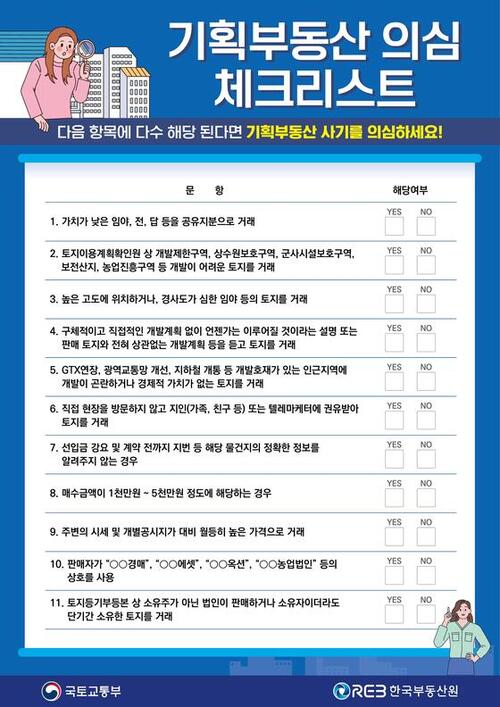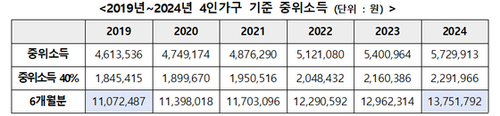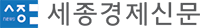심온이 위세 좋게 중국으로 떠나다 심온이 국가 전권대사의 임명을 받고 중국으로 떠나던 날. 태종은 환송인사를 전하러 갔던 환관이 보고한 내용을 믿고 싶지 않았다. “환송 나온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장안이 텅 비었다. 위세가 당당했다‘ 등등. 태종은 자신이 걱정했던 대로 벌어진 상황을 전해 듣고는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는 마음을 굳게 먹을 수밖에 없었다. 세상인심은 구름과 같아 기압골이 변하면 일었다가 산맥을 만나면 비를 뿌리고 사그라지듯 사라진다고 들어 왔다. 하지만 이날 한성 안팎에서 구름처럼 모여든 백성들의 의미는 다르게 여겨졌다. 심온이 일으킨 구름은 막 일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높은 산이 없으니 비를 뿌리고 소멸되려면 긴 시간이 남은 것 같았다. 태종은 구름이 눈이 되어 내릴 것 같은 변화에 등짝이 오싹했다. 오뉴월에 서리가 아니라 폭설이 내릴지도 모를 아찔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등에 얼음이 어는 듯 한기가 몰려왔다. 장안의 모든 관심이 온통 심온에게 집중되었다. 연도에 구름같이 운집한 사람들은 심온에게 칭송과 찬사를 보내는 동시에 부러워하며 시샘했다. 사람들은 심씨 가문이 대대로 왕실과 맺은 인척관계를 칭송했다. 심온은 바로 밑의 아우가 태조의 딸과 결혼하여 이미 왕실의 인척이었다. 심온은 태종 여동생의 시아주버니였다. 이번에는 심온의 딸이 도에게 시집갔다. 태종의 며느리 즉 도의 아내는 여동생의 시집 조카였다. 건국 초기 조선왕조 삼대에 걸쳐 인척 세력이 된 것이다. 왕실을 배경으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이루었다. 사관(史官)들도 심온을 못마땅하게 여기다 영의정 부사 심온의 자리는 빛났다.(영의정 부사는 뒤에 영의정으로 이름이 바뀐다) 심온이 제2인자 즉 한 사람 아래이건만 만인의 윗자리(一人之下 萬人之上)까지 오른 것이다. 사람들은 심온의 이런 모습이 그의 아버지 심덕부로부터 물려받은 세습권력이라 더 부러워했다. 그가 죽었을 때 실록은 “덕부가 온량(溫良)하고, 청렴하고, 공근(恭謹)하고, 충성하고, 부지런하여, 착한 일을 많이 하였으므로, 죽으매 나라 사람들이 아깝게 여기었다.”고 극찬했었다. 행렬이 서대문을 지나 무악재를 넘어 연신내에 이르는 길에는 인파로 넘쳤다. 지금이야 탄탄대로이나 당시의 무악재는 호랑이가 출몰하던 곳이었다. 그 좁은 고갯길을 화려한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무리 지어 가니 구경거리로는 이보다 더한 것이 없었다. 태종이 보낸 환관을 비롯하여 임금과 중궁이 보낸 환관까지도 환송인사 차 따라 갔으니 구경거리 치고는 최고가 되고도 남았다. 갤러리가 넘치는 프로 골프시합보다도 더 화려하고 당당했을 것은 뻔하다. 심온의 이번 행차에 몰려든 사람들은 그의 행장도 행장이려니와 당당한 모습을 부러워하면서도 시샘했음이 실록에서도 은근하게 배어남을 느낄 수 있다. 사관들은 절대로 사사로운 감정이나 파벌, 가문 등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을 목숨처럼 여기어 기록한 사관들의 눈에도 심온의 행렬은 아니꼽게 보였다. 불편부당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관들의 눈에 공정하게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 심온에게는 경고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실록은 세종 즉위년인 1418년 9월3일 그의 중국행을 “임금의 장인으로 나이 50이 못되어 수상의 지위에 오르게 되니, 영광과 세도가 혁혁하여 이날 전송 나온 사람으로 장안이 거의 비게 되었다.”고 전한다. 오죽하면 사관들이 장안이 ‘거의 비었다’고 기록했을까. 더하여 50도 안되는 나이에 제2인자 자리에 올랐음을 거론했다. 연공을 중시하던 당시 유학자들의 눈에는 이것도 곱게 비치지 않았다. 사관이 보기에도 이날의 행장은 지나침이 없지 않다는 비아냥거림이다. “영광과 세도가 혁혁하다”는 기록에서도 그대로 묻어난다. 세도와 영광 중 하나만 가져도 부러울 판에 두 개를 한 몸에 모두 받았다. 태종은 심히 불편했다. 외척의 힘을 줄여야 임금의 자리가 튼실해짐을 경험으로 알았다. 중전의 말이 권위를 얻으면 왕의 입지가 좁아진다. 태종은 문전성시(門前成市)란 고사를 떠올렸을 것이다. 문전성시의 불가함을 천명하다 중국 전한 11대 황제인 애제가 즉위하자 조정 실권이 외척들 손에서 움직였다. 외척이며 국방장관을 역임하고 있던 왕씨 일족의 전횡도 모자라 역시 외척인 부씨(할머니 친정)와 정씨(어머니 친정) 두 가문도 권력을 휘둘렀다. 당시 나이 스물인 애제는 국정을 팽개치고 잘못된 사랑에 빠졌다. 모든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으나 소용없었다. 한번 잘못 빠진 사랑을 막을 힘은 누구에게도 없었다. 한 장관이 거듭 말리다가 오히려 미움을 받았다. 어느 날 아첨배가 애제에게 장관의 집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서 시장을 이룬 것 같다고 모함했다. 애제가 이 말을 듣고 장관을 힐난하자 그는 ‘물같이 깨끗하다’며 조사를 명하라고 요청했으나 묵살했다. 애제는 아첨꾼을 꾸짖고 장관을 구하려던 관리를 오히려 삭탈관직했다. 혼란이 극에 달했고 결국은 왕씨 가문에게 나라를 넘겨주고 말았다. 도가 왕위에 오른 날 심온이 청천 부원군에 올랐다. 왕의 장모 안씨는 삼한 국대부인으로 삼았다. 왕의 장인으로 합당한 예우를 받은 것이다. 갑자기 직위가 껑충 뛰어 올랐다. 딸을 잘 둬 왕의 처가가 되고 보니 하루 밤새에 신분이 달라졌다. 이런 것을 두고 사람팔자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가보다. 충녕대군에게 딸을 시집보낼 때는 왕실과 인척관계를 맺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심온이었다. 그러나 세자가 폐위되고 사위가 세자에 오르고 100일도 채 안되어 왕위에 오르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상왕의 의도에 따라 사은사를 교체하다 조선은 도가 왕이 되었음을 중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했다. 도가 세자가 된 것을 승인받으러 간 사신이 돌아오기도 전에 바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또 중국에 알려야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태종은 양위의 구실을 여러 가지로 생각했다. 대신들과 상의도 했다. 세종은 사은사로 한장수를 임명했다. 하지만 꼭 일주일 뒤 태종이 한장수 대신 심온을 사은사로 지명한다. 도는 태종의 추천으로 심온을 중국에 가는 사은사로 임명했다. 태종이 반드시 친척을 사은사로 보내야한다는 말에 따른 것이다. 세종 즉위년(1418년) 8월 23일 실록은 상왕이 말하기를, “사은사는 반드시 친척을 보내야 한다. 한장수가 비록 친척이긴 하지만 심온만 못하고, 또한 황엄은 평소에 온을 알고 지내는 사이이니, 온이 간다면 엄은 반드시 정성을 다할 것이다.”라고 기록했다. 중국의 환관 한 사람과 친밀한 사이라고 사신으로 보낸다는, 구실치고는 엉성한 구실을 들었다. 한장수가 태종과 어떤 친척 관계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한창수라고 하기도 하지만 한장수가 한창수와 동일인물인가를 실록에서는 못 찾았다. 심온만 태종의 뜻을 읽지 못했다 태종의 이런 생각은 벌써부터 심중에 새겨져 있었다. 태종은 도에게 국보를 넘겨주던 날 다음해 새해를 축하하기 위한 사신과 관련 이미 “사은사는 마땅히 찬성 심온을 차견(差遣)하여야 할 것이다.”고 정해 놓았다. 이와 함께 “전위한 뒤에도 내가 마땅히 노상들과 임금을 보익하고 일을 살필 것이다.”라며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나라를 넘겨주면서까지 심온을 보내라고 못 박았다. 태종은 말 못할 깊은 뜻을 숨기고 의도한 대로 하나하나 일을 진행해 나갔다. 심온은 이런 상황을 눈치 채지 못했다. 알았더라면 환송객도 못나오게 했을 것이고 행장도 가능하면 검소하게 차렸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심온의 편이 아니었다. 태종이 왕위를 물려주기 2,3일전부터 큰비가 내렸다. 지진도 있었고 천둥과 번개도 쳤다. 상서롭지 못한 징조였다. 그 다음날 태종이 왕위를 인계한다는 발표가 뒤따랐다. 박은과 이은이 태종의 뜻을 읽고 “임금께옵서 전위하려 하심을 신들은 편안히 쉬시려는 것으로 생각하였삽더니, 이제야 임금의 뜻을 알았나이다. 청컨대 교서를 내리시와 전위하시는 뜻을 밝히 타이르시어, 신민의 심정을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청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