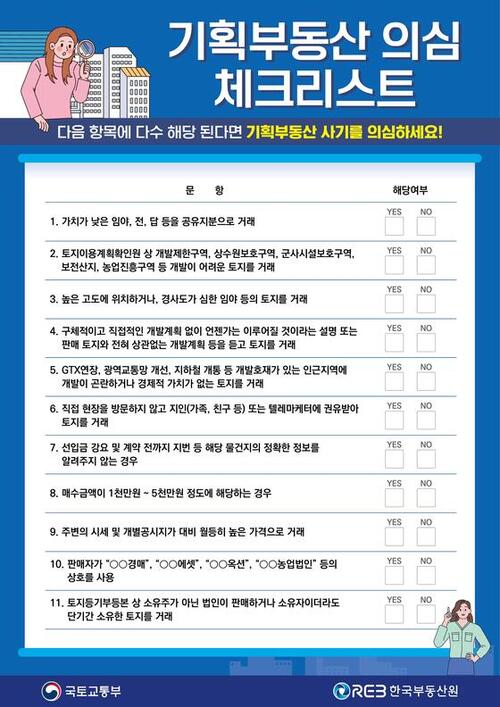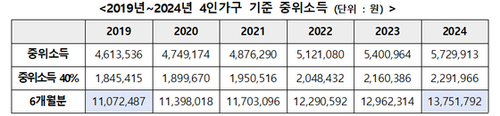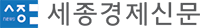사신접대에 총동원을 내리다 도는 태종이 물려준 조중외교관계를 더 충실하게 지켰다. 조중우호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중국을 섬겨야 하는 완벽한 변방제후국가의 자세였다. 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강조했다. 도가 왕위에 오르고 첫 번째 사신을 맞는 일정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사신 육선재가 요동을 거쳐 한양까지 오는 길이다. 육선재가 요동에 도착했다는 것을 중국에 갔던 우리 대표단 원민생이 도에게 미리 알리니(즉위년인 1418년 8월 22일) 도가 그에게 쌀과 콩 50석, 안장을 갖춘 말 한 마리를 선물로 내려준다. 물론 원민생이 조선에서 걱정하던 문제를 중국에 가 황제에게서 허락을 받아 오는 것이니 겸사겸사 포상을 할만도 하다. 원민생이 가져간 문서는 세자를 새로 세워도 되느냐고 자문한 것이다. 도는 사신을 영접하기 위해 이종무를 당장 의주로 보냈다. 이종무는 뒤에 대마도 정벌에 성공한 바로 그다. 이종무 편에 선온(宣醞 임금이 내려 주던 술)을 보내며 그의 일정을 보살피라고 단단히 이른다. 의주에 도착한 사신이 처음으로 받은 환대다. 먼 길에 힘도 들었겠지만 조선 임금이 직접 좋은 술을 보냈으니 만족했고 우쭐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술이 도의 것인지, 태종의 것인지 이미 알고 왔을 것이다. 중국에다 대고 국내 사정을 미주알고주알 고자질하는 세력들이 분명 있었을 테니까. 사신은 하지만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했다. 그런 말을 했으면 조정에서 한바탕 소동이 났을 터인데 기록이 없다. 24일에는 이조 판서 정역 편에 또 술을 들려 평안도 안주로 보냈고, 이종무와 임무를 교대했다. 25일 도총제 노귀산을 평양에, 26일 판돈녕부사 권홍을 황주에, 30일 길창군 권규를 유후사(留後司 개성에서 서울로 왕궁을 옮기고 두었던 관아)로 보내면서 원민생과 동행케 했다. 권규는 술상무 역이고, 원민생은 영접관 역이었던 것이다. 9월2일에는 우의정 이원과 참찬 김점을 벽제로 보내, 그곳에 있던 역에서 머무르게 했다. 도는 또 이종무를 사신이 한성에 머무는 동안 영접과 접대를 맡은 총책임자로 임명했다. 중국 문고리 실세와 조선 외교 9월 7일. 도가 모든 신하를 이끌고 사신이 머무르던 태평관으로 갔다. 도가 사신을 초빙해 태종에게로 가자 태종이 광연루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태종은 사신에게 스스로 ‘중국 황제의 신하가 되었다’면서 황제의 덕을 칭송한 시가 적힌 족자를 보였다. 자존심 센 태종에게는 무엇보다 싫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자칫하면 삐걱거릴 조중의 불편한 외교상황을 순조롭게 넘기기 위한 사신정치를 펼치는 순간이었다. 준조절충(樽俎折衝 술자리에서 유연한 담소로 외교를 비롯한 일들을 유리하게 한다는 말). 사신이 왔으니 한양에서 해결해야 했다. 태종은 숨기지 않았다. 태종의 외교술에 중국 사신도 화답하기 시작했다. 태종이 족자에 적힌 시의 숨은 뜻을 알리자 사신 육선재는 이미 알고 있다고 했다. 중국인들의 전통인 먼저 이야기 하지 않는 외교가 조선의 준조절충과 한 합을 겨뤘다. 술이 두 순배 돌자 본격적인 이야기가 오고갔다. 술을 많이 마시면 파탄이요, 적당히 마시면 윤활유라. 분위기가 바뀌었다. 태종이 먼저 운을 떼자 사신도 그제야 말을 꺼냈다. “전하께서 권섭(權攝 어떤 일을 임시로 맡아봄)왕으로 하여금 또 명명을 받도록 하자는 뜻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라 속내를 드러낸다. 태종이 핵심을 찔렸다. 사신은 황제와 가장 가까이 있는 환관이라는 것도 은근히 과시한다. 그가 전에 태종이 보낸 시를 보았고, 모두 황제에게 고했노라고. 황제가 “이를 가상하다”고 했으니 황제도 전하의 뜻을 알고 있단다. 세자 문제를 하락한 것이니 “권섭왕이 명명을 받으시게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라고 태종이 듣길 고대하던 말도 꺼냈다. 태종이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던 말을 들었다. 준조절충의 효과 100%. 사신을 구워 삼는데 성공한 것이다. 의주에서부터 한양까지 10여 일 간 접대한 술에 녹은 것일까. 환대에 화답한 것일까. 중국인들은 지금도 모든 거래에서 어떤 경우든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다. 상대가 애달아 먼저 이야기할 때를 기다린다. 바쁜 사람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좋은 조건을 내걸게 마련. 중국인들은 이때를 이용해 왔다. 이번에는 그러나 환관들이 먼저 마음을 연 것이다. 도가 외교에서 거둔 첫 번째 결실이다. 장사 속에는 장사 속으로 맞섰다. 철저한 장사치의 세계를 거닌 것이다. 태종은 체면도 접고 아들 도를 위해 “대인이 이미 나의 뜻을 알고 있으니 나를 위해서 잘 아뢰어 주시오.”라 마지막 당부를 했다. 쐬기를 박자는 뜻이다. 중국인의 의리를 바탕에 깔고, 믿어보자는 심산이었다. 사신도 “내가 장차 갖추어 아뢰겠나이다.”라 답했다. 조선이 멀리 있으니 황제에게 알리는 실세를 구어 삶은 것이다. 요즘 시중에서는 이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문고리 실세’라고들 한다나. 태종은 그날 사신에게 좋은 말 한 필과 담비 가죽 한 장을 선물로 주었다. 이에 앞선 4일. 사신이 황제의 칙서를 임금에게 전했다. 도가 태종을 모시고 모화루에 가 사신을 맞이했다. 조선 조정 전체가, 아니 조선이란 나라가 사신에게 달려 간 셈이다. 사신을 경복궁으로 초청해 와 의식을 거행했다. 사신에게 도와 태종이 애면글면하는 모습을 다행이도 들키지는 않았다. 칙서는 태종이 도를 세자로 삼은 것을 허락했다. 이 자리에서 태종은 사신에게 비로소 왕의 자리를 도에게 물려주었음을 밝힌다. 이날 실록은 “나는 본래 병이 있어 아들 도를 후사로 삼기로 하여 원민생을 보냈었던 바, 그 후에 병이 더 심하게 되어서 도로 하여금 국부를 권섭하게 하였노라”고 기록했다. 태종은 곧바로 행사장 임시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피했다. 중국 사신 앞에 새 임금을 앉힌 것이다. 도가 주관하여 사신과 행사를 마쳤다. 사신은 태평관으로 돌아가고, 도도 뒤따라가 그 곳에서 하마연(사신이 도착하는 날 행하던 연회)을 베풀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도착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쯤 된다. 사신은 중국 명나라 황제가 파견하여 보낸 환관이었다. 황제를 최고 가까운 거리에서 보필하는 환관을 조선에 보낸 것이다. 황제는 환관을 자신의 분신으로 여겼다. 조선에서도 환관을 황제에 버금가는 것으로 예우했다. 물론 조선 사람들도 어명이 곧 임금의 분신인 것처럼 받들기는 마찬가지었다. 도는 칙서를 받은 그 다음 날(5일) 지신사(후에 도승지) 하연에게 안장을 갖춘 말, 의복 갓 신 등 선물을 들려 보내 사신에게 안겼다. 태종은 병조 참의 원숙을 보내 안부도 물었다. 저녁에는 도가 태평관으로 가서 다시 연회를 베풀었다. 그날 이후 우리 조정의 문안은 계속된다. 6일 도는 좌대언 김효손을, 태종은 병조 참판 이명덕을 보냈다. 사신은 이날 명나라 궁중에 가 있는 조선 여성의 본가에 가서 부모형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살폈다. 조선 왕실에 일종의 외교적인 조건이 있음을 알리는 행사였다. 자국민 보호정책이며 일종의 경고였다. 중국 정부를 대신해 달라는 뜻이었다. 중국에 아양 떨고 선물 바치기 9월 8일 우대언 성엄을 사신에게 문안 보냈다. 도는 황제에게 바치는 사은표를 마무리했다. 최초의 외교문서다. 하지만 도가 중국으로부터 왕위 계승을 승낙받지 못해 보내는 이는 태종이었다. “사신을 바닷가 나라에 보내시니”라며 사신이 조선까지 와 도가 세자가 되게 허락한 것을 감사했다. “은혜는 몸을 부수어 가루가 되어도 갚기 어려울까 하나이다.”면서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동쪽 밖에서 더욱 중성을 바치겠나이다.”라고 맹세한다. 이와 함께 선물을 바리바리 실어 보냈다. 안장 2개, 각종 모시와 삼베 150필, 자리와 방석 100장, 인삼 200근, 잣 200근, 잡색말 26필이다. 황태자에게도 편지와 선물을 빠뜨리지 않았다. 물론 최고의 아양도 떨었다. 다음 대를 위한 사전 외교인 것. 황태자에게 보내는 외교문서인 전(箋)에는 황제의 은혜를 널리 선포하여 “멀리 바닷가까지 덮여 젖게 하시니”라며 황태자를 추켜세우고는, 항상 건강하길 바란다고 맺었다. 예물로는 황제보다는 적지만 각종 모시와 삼베 40필, 자리 20장, 인삼 50근, 잣 50근, 잡색말 4필을 보냈다. 태종과 도는 사신에게 한껏 몸을 낮췄다. 몸을 구부려도 정말 많이 구부렸으나, 마음은 될 수 있는 데까지 사렸다. 태종은 사신의 입에서 만약 나쁜 말이 나왔다면 책임은 자기가 지고, 도와 조선은 구할 심산이었다. 미리 양위를 서둘렀던 뜻이다. 조선이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는 것이 태종의 마지막 바람이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