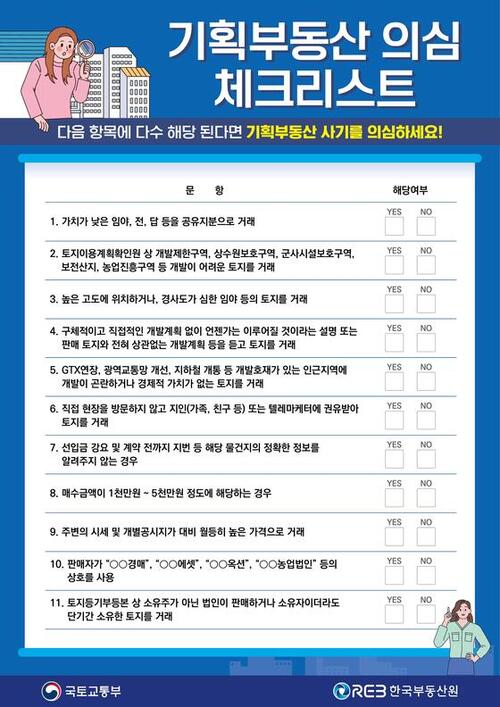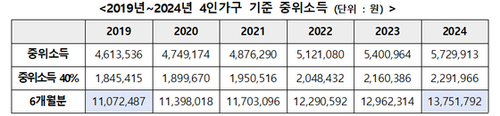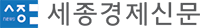|
“아버지 대통령이 100만 군중 앞에서 한 약속도 식언이 된 부정부패 척결, 따님 대통령이 말 몇 마디로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을까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데 갑자기 부정 부패추방이라는 찬바람이 일어 공직사회가 뒤숭숭합니다. 일 년 열두 달 가야 남의 돈 한 푼 공짜로 받아먹을 일 없는 대다수의 힘없는 국민들이야 “그전에 심심하면 하던 거 또 하나보다” 하고 말겠지만 그래도 공직이라고 앉아 재미 좀 보던 사람들은 저녁 잠자리가 편치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수 없게 찍히기라도 하면 당하는 건 시간문제이니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말입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정부패의 비리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하고 국무총리도 “부정부패를 가차 없이 척결하겠다.”고 벼르는 것을 보면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1971년 4월 25일 서울 장충단공원에는 1백만 군중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이틀 뒤 치러질 7대 대통령선거에 세 번째 출마한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며칠전 그 자리에서 열렸던 신민당 김대중 후보의 유세에 1백만 시민이 운집(雲集)해 기세를 올리자 비상이 걸린 공화당이 전국에 총동원령을 내려 맞불을 놓기 위한 매머드집회를 연 것이지요. 당시 상황은 두 해전 3선 개헌의 공화당 단독처리로 민심이 악화돼 자칫하면 정권이 넘어 갈수도 있는 분위기라서 공화당은 초비상이었습니다. 유세는 박정희후보가 연단에 오르면서 순식간에 열기로 휩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저를 지지해 주신다면 이 땅에서 영원히 부정부패를 추방하고야 말겠습니다.” 비장한 목소리로 읍소하던 박 후보는 격정에 겨운 듯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고 청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장충단계곡을 뒤덮었습니다. 그 시절 역시 사회 전반에 비리와 부패가 만연되어있던 때라서 ‘부정부패 척결’은 대선공약으로 약발을 받는 첫 번째 메뉴였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는 그 보다 꼭 10년 전인 1961년 5월16일 새벽 쿠데타 때 발표한 소위 ‘혁명공약’ 세 번째 항에서 “이 나라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의 ‘마지막 한번만…’은 10년 전 자신이 내건 공약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이틀 뒤 치러진 선거는 박정희후보가 634만2828표(53.2%), 김대중 후보가 539만 5900표(45.2%)로 90만표 차로 박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칫 했으면 정권을 빼앗길 뻔했던 아슬아슬한 결과였습니다. 이기긴 했어도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대통령은 1년 뒤 악명 높은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간접선거로 헌법을 바꿔 79년 서거할 때까지 서슬 퍼런 18년 장기집권을 유지합니다. 부정부패 척결하면 1950년대 대만의 장개석정부가 벌였던 ‘부패대청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49년 모택동에게 거대한 대륙을 빼앗기고 본토서 쫓겨나 대만으로 도망 친 장개석은 자신의 패배가 국민당 정권의 부패 때문이었음을 절감하고 이내 정화작업에 들어갑니다. 부패추방운동은 관료사회는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범국가적으로 진행됐고 이때 걸려든 것이 조카며느리였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처단한다는 추상같은 엄명에 수많은 비리혐의자들이 구속됐고 그 중에는 밀수에 연루된 조카며느리마저 포함이 됐습니다. 당시 소문에는 권총이 든 상자를 보내 자결하게 했다느니, 손목을 잘랐다느니, 또 비행기에서 떨어뜨려 죽였다느니 하는 풍설이 나돌았지만 사실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 부패적결을 얼마만큼 철저하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일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만은 이를 계기로 공직 사회가 깨끗해졌고 그런 정풍운동이 경제, 사회,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 자타 공인된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자유당도 그랬고 그 뒤 다른 어느 정권도 깨끗한 정권이 없었습니다. 60년대 서울의 한 호텔에는 아주 공개적으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재벌들이 앞다퉈 ‘성금’을 바치게 한 정당도 있었습니다. 또 몇 해전만해도 지하주차장에서 차떼기로 돈 포대를 주고받던 사건은 아직도 국민들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역대 어느 대통령도 부패척결을 호언장담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기자들과 칼국수로 점심을 들면서 “앞으로 단돈 10원도 받지 않겠다”고 대갈일성(大喝一聲)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였을 뿐입니다. 본인이야 받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수족들이 뒤로 챙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대통령들 역시 부인 아니면 형님, 아들들, 측근들이 그 짓을 했으니 부패추방은 소리만 컸지 결과는 언제나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 되곤 했습니다. ‘태산이 흔들리더니 겨우 쥐 한 마리’?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고구마를 캐는 원리와 같습니다. 호미로 흙을 파면 줄기에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려 나옵니다. 큰 것, 작은 것, 그렇게 파다보면 결국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진상을 파헤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칼끝이 측근에게, 수족들에게, 결국 자신에게 오고 정권이 무너지는데 어찌 끝장을 볼수 가 있겠습니까. 용두사미(龍頭蛇尾)로 어물어물 끝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는 이미 고질병이 돼 있습니다. 왜 50년 전 박정희장군이 혁명공약으로 부패추방을 선언했고 10년 뒤 눈물을 흘리며 다시 부패추방을 공약했겠습니까. 창피한 이야기지만 북한은 우리 사회를 가리켜 썩지 않은 곳이 없다고 흉을 본다고 합니다. 전 현직 참모총장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는 것을 보고 약을 올리려는 것이겠지요. ‘사돈 남의 말’하는 꼴이지만 사실여부를 떠나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왕에 칼을 뽑았으면 철저하게 썩은 곳을 도려 내야합니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역사적인 사명으로 가차 없이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을 정화해서 나라를 맑고 깨끗하게 만드십시오. 대통령의 평소 ‘고집’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고질이(痼疾) 된 이 나라의 부정부패, 그 암 덩어리만 깨끗하게 잘라 낸다면 박대통령은 아버지가 못 이룬 유업도 달성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 석 자에 ‘위대한 대통령’을 붙여 청사(靑史)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