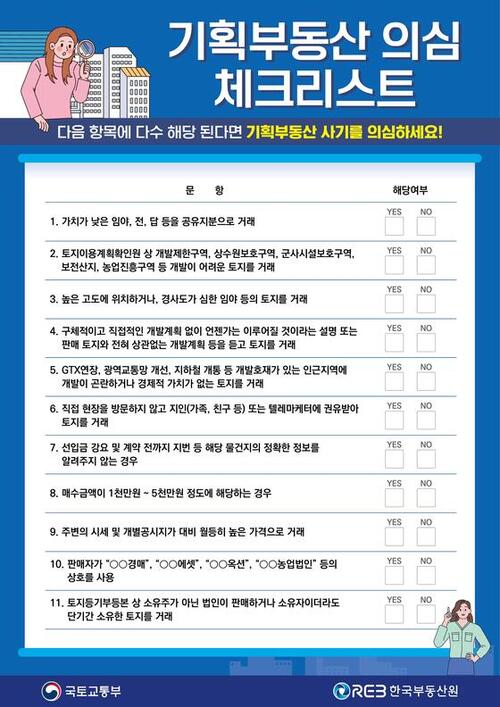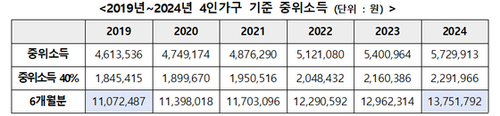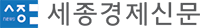국제사회는 냉엄하고, 외교에는 국익이 우선이라지만 국가 간의 신뢰 또한 중요하다.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의 실리추구는 변심한 연인에게 구애하듯 어렵지 않겠는가. 미국이 일본을 껴안는 최근의 전략과 과정은 그런 의미에서 냉철하게 성찰해 볼 일이다. 아베 일본 총리의 미 의회연설에서 쏟아낸 아부성 수사와 미국 정치인들의 넘치는 칭송은 세계의 시선에 착잡함을 드리우기에 충분했다. “깊은 뉘우침으로 침묵의 기도를 했다”고 빌고, 노래 가사까지 인용해 “맞아요, 미국은 우리의 친굽니다”라고 국가 원수의 품격이 무색한 언어로 우정을 애원했다. 아베가 그렇게 뉘우치고 살가운 위인인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게는 놀랍도록 낯설다. 미국 정계는 화답하듯 그를 일본의 뛰어난 지도자로 치켜세우면서 의전도 뛰어넘는 극진한 대우를 했을 뿐 아니라, 군국주의 부활 우려를 낳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선물로 안겼다. 자위대의 정규화와 헌법개정 등 휘발성 강국에의 길을 터준 것이다. 면종복배로 배신당했던 태평양 전쟁의 역사는 까맣게 잊은 듯하다. 적대적 과거를 묻어버리고 전향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반전(反轉)외교는 격동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피할 수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그럴만한 믿음과 명분아래 매듭을 깔끔하게 풀고 새로운 통로를 열겠다는 진정성이 전제돼야 한다. 필요하다고 덥석 밀착한다면 필경 후환을 부를 수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곁에 두려하고, 일본은 미국을 방패 삼아 일어서겠다는 속셈은 세상이 다 아는 노림수다. 꼭 그래야 될까? 미국의 지도층은 중국이 적국이 아니라고 수시로 밝힌다. 그것은 힘이 아니고 문화와 친선, 협력으로 대처한다는 소프트 파워의 표방과 부합한다. 그럼에도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일본을 파트너로 끌어들여 군사적인 부담을 분담시키려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에 자본주의를 접목하고,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 성장하는 만큼 체제를 위협하지도 않는다. 미국과 중국의 국민총생산액은 17조 대 10조 달러이고, 개인소득은 5만5천 대 7천 불이며, 국방비는 6천 억 대 2천 억 불로 아직 큰 차이가 난다.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무리수를 둘수록 지구촌 리더로서의 입지는 깎일 것이다. 중국의 팽창이 부러우면 미국도 발군의 계획과 투자로 경쟁을 하면 될 일이다. 빚으로 흥청방청 살면서 물리적인 억제를 시도하는 짓은 아름답지 않다. 미국이 일본과 밀착하면 할수록 한국을 비롯한 일본에 원한과 경계심을 갖고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게 서먹해질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연구자, 마이클 그린은 일본을 평화위협으로 보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라고 말한다. 다분히 일본의 편에서 보는 견해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당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판단력이 없다는 뜻인가. 또 그 외에 일본의 교활함과 야심을 알고 있는 세계의 시선이 가려졌다고 보는가. 그는 말하지 않고 있는 일본 밖 국제사회의 경계심과 경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일관계의 복원을 권고하는 압박은 역사문제와 국교정상화의 분리추진론까지 낳았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와 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등으로 다발적인 도전을 계속하는 한 한국국민의 정서상 쉽게 풀릴 수없는 방정식으로서 한국정부만 더 곤경으로 밀어넣고 있다. 미국이 진정으로 동북아의 안정을 구상한다면 미국에게는 나긋나긋한 일본을 먼저 설득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