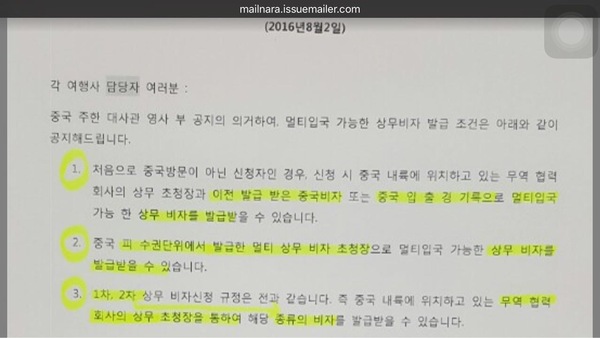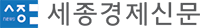옴스크 드라마 극장에서 토볼스크 문이 있는 이르티시 강가까지 멀지는 않았으나 가는 동안 그쳤던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토볼스크 문은 눈 내리는 이르티쉬 강변 언덕에 쓸쓸하게 서 있었다. 붉은색 지붕에 노랗고 하얀 벽을 가진 아담한 아치형 문이다. 과거에는 문 좌우에 담장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문만 홀로 덜렁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문 주변에는 오래된 벽돌 건물들이 몇 채 서 있었다. 토볼스크 문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창고처럼 생긴 건물에 다가가니, 건물의 쇠창살이 살벌하다. 굵은 쇠창살로도 모자라 창살 사이사이에 뾰족한 칼 모양의 작은 쇠조각들을 붙여놓았다. 죄수들이 머물던 집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지옥문으로 보였을 토볼스크 문 토볼스크는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출발한 죄수들이 유형지 옴스크로 가는 길에 경유하는 도시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토볼스크간의 현재 도로상의 거리는 2,806km. 토볼스크에서 옴스크는 610km. 토볼스크와 옴스크는 이르티시 강으로 연결이 된다. 이르티시 강은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이루는 알타이 산맥에서 발원해 서 시베리아를 남북으로 지나는 길이 4248km의 긴 강이다. 죄수들은 토볼스크에서 배를 타고 옴스크로 올 때가 많았을 것이다. 뱃길이 이동 시간을 훨씬 단축시키기 때문이다. 죄수들은 강변에서 배에서 내려 언덕 뒤의 토볼스크 문을 지나 으시시한 쇠창살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이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마지막 도착지인 요새안의 수용소로 가지 않았을까. 정치범으로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져 옴스크까지 끌려온 도스토옙스키도 이 문을 통해 수용소로 갔을지 모른다. 도스토옙스키가 이송되던 때는 강이 꽁꽁 얼어붙은 1월이었으므로 죄수들을 실은 말썰매가 얼어붙은 강 위를 달렸을 가능성이 있다. 마차 시절에는 겨울에 울퉁불퉁한 육로 대신 강이나 호수의 얼음 위를 달리는 일이 흔했다.  지금은 하나의 구경거리요 기념물로 남아있지만, 당시 죄수들 입장에서 보면 강변 위의 토볼스크 문이야말로 ‘지옥문’으로 보였을 것이다. 토볼스크 문을 지나 언덕 끝으로 가니 강변의 모래사장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었다. 눈은 더 거세졌다. 10월초여서 아직 땅이 얼지 않아서인지 모래위로 내리는 눈은 쌓이지 않고 녹아버렸고, 인근의 나지막한 풀밭에 떨어진 눈은 파란 풀잎 위에 하얀 꽃처럼 조금씩 쌓이고 있다. 강폭은 넓지 않았다. 강 저편에 배가 한척 지나가고 있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급의 선박이다. 강변에는 낚시대를 던지는 낚시꾼들도 있었고, 갈매기도 몇 마리씩 날아 다녔다. 토볼스크의 문이 왜 옴스크에 있나? 옴스크에 있는데 왜 토볼스크 문이라고 하는지 잠시 설명을 해야겠다. 러시아는 땅이 커서인지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들이 더러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 제일 큰 기차역은 서울역이다. 그런데 모스크바에는 모스크바역이 없다. 역이 몇 군데 있는데 행선지별로 레닌그라드역, 벨로루시역, 야로슬라블역 등 도착지의 이름을 붙인다. 러시아 같이 영토가 큰 나라에서는 때로는 그것이 더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옴스크에 토볼스크의 문이 있는 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옴스크에 사는 사람은 토볼스크 문으로 가면 토볼스크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었을 것이다. 동 시베리아의 중심도시 이르쿠츠크에는 앙가라 강변에 모스크바 문이 우뚝 서있다. 이 역시 모스크바 쪽으로 가는 문이라는 의미다. 모스크바 쪽에서 오는 사람도 강을 건너와 이 문을 통해 이르쿠츠크로 들어왔다. 지금은 도로와 기차, 비행기가 발달하여 육지에서는 배를 이동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적지만, 과거 19세기 말까지는 육로보다는 뱃길이 더 빨랐다. 토볼스크의 문에서 수용소가 있는 요새까지는 한참을 더 가야 한다. 수용소를 어떤 책에서는 감방으로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당시 시베리아 유형수들이 있던 곳은 감방이라고 하기 보다는 수용소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도스토옙스키의 기록이나 당시 사진 들을 보면 그곳은 방이 따로 있는 감방이 아니라 군대의 막사 같이 나무로 만든 수용시설이기 때문이다. 밤이면 밖에서 문이 잠겨 아침이 될 때까지 악취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잠시도 빠져나올 수 없었다.(계속)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